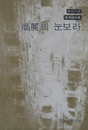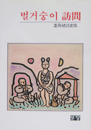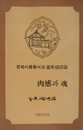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사행시
- 작품명
- 사행시
- 저자
- 강우식(姜禹植)
- 구분
- 1970년대
- 저자
- 강우식(姜禹植, 1942~) 1942년 1월 15일 강원도 주문리 출생. 성균관대 국문과에서 수학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66년 <현대문학>에 <박꽃>, <사행시초> 등이 추천을 받아 문단에 등단했다. 문학예술사를 주관했고,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20회 현대문학상, 제15회 한국시인협회상, 제6회 한국펜클럽 문학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집 <사행시초>(1974), <고려의 눈보라>(1977), <꽃을 꺾기 시작하면서>(1979), <벌거숭이 방문>(1983), <시인이여 시여)(1986), <물의 혼>(1986), <설연집>(1988), <어머니의 물감상자>(1995) 등을 간행했다. 그의 시는 한국시의 전통적 음악성에 바탕을 두고 강한 향토적 색채감각으로 고향의 세계를 애틋하고 강렬하게, 때로는 관능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간결한 표현을 통해 함축성 있는 시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리뷰
- 강우식이 우리에게 사행시(四行詩)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도 근 십 년이 되나 보다. 형태상의 시험으로 간혹 쓴 사람도 있는 걸로 알지만 강우식 그처럼 끈질기게 늘어붙어 그 형태에 집념을 보인 사람은 아직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사행시만으로 한 권 시집을 엮기까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하겠다. 그의 사행시는 행이 넷이라는 것뿐, 정형의 자수는 없다.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고유의 시가에서 기본율조를 이루고 있는 삼사조(三四調) 혹은 사사조(四四調)의 리듬을 자유롭게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형시(時調)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비교적 일정한 리듬에 구속되고자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일까. 내 나름의 해답은 언뜻 다음과 같은 사실을 떠올렸다. 정형시의 ‘구속’과 자유시의 ‘자유’를 다같이 현대시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가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는 특이하게 사행시라는 반정형(半定型)에 착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이다. 이런 반정형은 자유시가 무턱대고 내세우는 내재율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도 되고, 또한 시조가 자수율만을 앞세우는 그것도 아울러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혹은 율조(律調)에 대한 ‘허무한 구속’이나 ‘맹랑한 자유’에서 다같이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사행시라는 반정형의 중간지대를 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말할 나위도 없이 시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다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시에서는 이 형식을 무시한 감이 너무 짙으며, 또한 시조에서는 비록 형식은 갖추었다고 하나 그 형식에 맹종한 나머지 내용을 소홀히 한 감이 너무 짙다. 이 대조적인 지양(止揚)을 함께 노려서 강우식은 사행시를 열었고, 거기서 기틀을 세웠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구체적인 현장을 우리는 이 시집에서 살피게 된다. 그의 시세계에 대하여서는 그전에 내 나름의 단편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다. ‘서민적 주색(酒色)이라 할지 가난의 양상이라 할지 그런 것을 날로 하고 한(恨)을 씨로 하여 엮은 그의 시는 한마디로 말해 질퍽하고 끈질긴 맛을 풍긴다’, ‘한국적 비애(悲哀)의 미학(美學)을, 또는 애증(愛憎)의 연면성(連綿性)이랄지 그 인연(因緣)이랄지 하는 정한(情恨)의 미진(未盡) 상태를 잘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고 썼던 글도 그러나 그의 이번 시집을 통독하고 나서 그다지 잘못 본 견해는 아니었다고 어느 정도 자부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새로 보게 된 것은 그가 주제 면에서 억척스럽게 천착하고 있는 색정적(色情的)인 한 세계였다. 시에서 그런 세계를 개현(開顯)시킨다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는 대답하게 그 세계에 대들고 있다. “속가랑이 벌리듯 꽃이 피네.” 손쉽게 든 이런 대목을 보면 그 색정적인 세계가 시에 잘 용해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만일 이런 색정적인 세계가 시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춘화(春畵)나 산문이 되어버릴 위험성까지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아슬아슬한 차이와 아슬아슬한 위험에서 용하게 구제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시작여정에 그의 극복의 의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발(跋)’, 박재삼, <사행시초>, 현암사, 1974
- 작가의 말
- (……) 그러나 나에게 오늘 시를 쓰도록 만들어 주신 근원적인 스승을 대라면 나는 아무래도 ‘바다’야말로 나의 시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태어나기를 파도소리를 들으며 태어났고, 또 파도가 높게 일면 그 물결이 거짓말 조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쏴아 하고 모래 언덕을 넘어서 우리집 단칸 마당 앞으로 지나치는 곳에서 자랐다. 바다는 늘 나와 함께 노래했고 울었고, 꿈을 꾸었다. 바다야말로 나이고, 나의 시이고, 나의 스승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바다는 깨어있는 자의 물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어디에도 한곳에 괴일 줄 모른다. 늘 생동력을 갖고 있다. 바다는 힘찬 물이다. 근원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바다를 보리라. 깨어있는 자만이 눈을 떠서 하늘을 보듯이 바다의 푸른색을 보고 그 푸름들이 움직이는 율동을 보리라. 깨어있는 자만이 물이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되리라. (……) 태생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바다 곁에서 자란 내 태생이야 어찌 할래도 어찌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나의 신분에 대한 공식적인 노출은 66년 <사행시초>의 추천사에서 밝혀진다. 그때 심사였던 미당 서정주선생께서 “들으면 그는 강원도 토종 어민의 아들이라고 한다”에서부터다. 그로 인해 지금도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일컫기를 ‘뱃놈의 자식’이라고 하길 서슴지 않는다. 그때마다 나는 힘이 생긴다. ‘뱃놈’, 듣기에는 좀 비하된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얼마나 건강한 힘이 깃들어 있는가. 그 시절에 서울로 올라올 때 나는 바다 하나만 가슴 속에 갖고 올라온 사람의 하나다. 바다처럼 좌절하지 말고, 때로는 넓고 한량없되, 또 때로는 태산을 뭉갤 수 있는 물소리가 되면서 살아가자고 바다 하나를 가슴에 담고 깨어 있는 물이 되고자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다. (……) 남들처럼 약지 못하고 기분 나면 내일 죽더라도 며칠밤이고 술에 젖고 또 돈에는 그렇게 악착 같아 본 적이 없는 나, 그래서 도대체 살아가는 것이 불가사의해 보였던 나, 내가 단 하나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키워준 바다의 원시적인 충동력이고 순수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도 생존의 물이 채워진다. 그렇지만 그 물들은 많이는 오염되고 가식적인 물이다. 그런 것들이 내 몸 속에 채워있다고 생각들 때면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든지 내 고향 바다의 물로 바꿔 채워 넣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춤춰온 사람이다. 깨어있는 물로 살아가리라. 깨어있는 물과 같은 시를 쓰리라. 그 시절 이후 10년, 그러니까 내가 문단이라는 데 나와서 10년. 나는 첫 <사행시초>를 내놓았다. (……) ‘시, 깨어있는 자의 물’, 강우식, <물의 혼>, 예전사, 1986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물의 혼>, 강우식, 예전사, 1986 <사행시초>, 강우식, 현암사, 1974
- 관련멀티미디어(전체4건)
-
이미지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