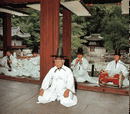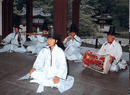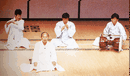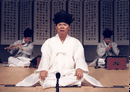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이양교 (1928.8.28~)
- 예술가
- 이양교 (1928.8.28~)
- 구분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관련정보
- 1975.7.12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 학력(계보)
- 1962. 이주환에게 가곡, 가사 사사
- 생애(약력)
- 1954.1. 서울염림서 촉탁 1956.1. 서울시 종로구청 촉탁 1959.10. 교육시보사 주최 전국시조경창대회 최고등부 입상 1969.1. 국립국악원 연주원 1969. 국립국악원 시조 강사 1977.12. 가사전 출간 1978.1. 국악협회 이사 1978. 추계예술대학 강사 1982. 가곡선집 출간 1984. 12가사전(악보)재판 1987. 가사음반 출반 1988. 시조음반 출반 1994.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1994. 서울가악회 회장 1994.11. 서울정도600년기념 자랑스런서울시민600인 선정 1995.5. 대만 도원현 세계민속예술제 초청공연 1996.10. 옥관 문화훈장 서훈 1999.5. 가사 공개행사 발표공연 가사, 가곡, 시조 공연(국립국악원 우면당) 2000.6. 공개행사 발표공연 가사, 가곡, 시조 공연(국립국악원 우면당) 2001.6. 정통 12가사 감상의 밤(국립국악원 우면당) 2002.9. 공개행사 가곡, 가사, 시조 발표공연(국립국악원) 2003.6. 서울가악회 창단 10주년기념 가사 공연(국립국악원 우면당)
- 리뷰
- 가사(歌詞)·가곡(歌曲)·시조(時調) 등 정가(正歌) 모두를 섭렵 서울 가악회(歌樂會) 결성… 전수(傳授)활동에 전념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聖上)이 바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오류춘광(五柳春光) 경(景) 좋은데 백마금편(白馬金鞭) 화류(花柳) 가자 이는 <청구영언(靑丘永言)>과 <가곡원류(歌曲源流)>에 실려 전하는 <백구사(白鷗詞)>의 첫대목으로, 임금에게 버림받은 작자가, 백구가 노니는 시골로 내려가 백구에게 놀라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함께 놀러 가자고 권유하는 내용인데,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歌詞)의 예능보유자 이양교(李良敎)씨가 12가사(歌詞) 중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곡이기도 하다. “옛날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전원에서 물외(物外)의 한적을 즐기며 지었다는 <백구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권주가(勸酒歌)>도 곡조는 좋지만 기생들이 많이 부르는 바람에 품격이 떨어져서 정작 무대에는 자주 올리지를 않지요.” 가사(歌詞)는 가곡(歌曲)·시조(時調)와 함께 우리나라 정가(正歌)(歌樂)의 한 갈래를 이루는 성악곡으로 가사체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로 담은 노래인데 현재 12곡이 전하고 있어 12가사라고도 부른다. 가사와 가곡·시조는 같은 정가(正歌)의 갈래이나 가곡과 시조는 같은 시조시(時調詩)를 얹어 부르는 노래인데 반하여 가사는 긴 사설을 노랫말로 하고 있으며, 가곡은 관현악의 반주가 반드시 따르는데 반하여 가사는 장구 장단 하나만으로도 족하며 굳이 반주를 한다 하더라도 피리·대금 등의 관악반주면 충분하고, 시조는 아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비전문가의 노래인데 반하여 가사는 가곡과 같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노래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12가사는 <백구사(白鷗詞)>, <황계사(黃鷄詞)>, <죽지사(竹枝詞)>(일명 건곤가(乾坤歌)), <춘면곡(春眠曲)>, <어부사(漁父詞)>, <행군악(行軍樂)>(일명 길군악), <상사별곡(相思別曲)>, <권주가(勸酒歌)> 등 하규일(河圭一)이 전수한 8곡과 <수장산가(首陽山歌)>, <양양가(襄陽歌)>, <처사가(處士歌)>, <매화타령> 등 임기준(林基俊)이 전수한 4곡 등이다. 이중 <상사별곡>이 10박 장단이고 <처사가>와 <양양가>가 5박 장단이며, <권주가>는 무박 장단이고 나머지는 모두 6박 장단으로 되어 있다. 이 가사는 <청구영언> 시절에 이미 틀이 잡힌 것으로 보아 3백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간직했다고 할 수 있거니와 민요나 판소리 등은 일반서민들에게 친숙한 노래였지만 가사는 가락이 섬세하고 유장한데다가 사설이 복잡해 경서에 눈이 어두운 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사는 글깨나 익힌 선비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가사는 하규일(河圭一)과 임기준(林基俊)에게서 이주환(李珠煥)으로 전승되고 현재 이양교(李良敎)로 이어지고 있다. 가사의 예능보유자 석정(石汀) 이양교(李良敎) 씨를 ‘국립국악원’ 사범실로 찾아갔다. “교육방송에서나 간혹 찾을까, 일반 방송국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애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올해가 국악의 해인데도 이러니 딱한 일이지요. 그러나 현재 가사를 전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4천만명 중에서 선택받은 10명 안팎의 대단한 존재이다. 야구선수와 권투선수에 비길 처지가 아니다. 긍지를 가지고 정진하라’고 격려합니다. 3백년 역사의 정가의 맥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928년,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강당리, 서당이 5개나 있어 일명 서당골이라 불렀던 동네에서 서당 훈장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동네 유학자들의 풍류생활을 직접 보면서 자랐다. 국민학교 때부터 어른들 어깨너머로 시조가락을 따라 읊었다. 모창(模唱) 수준이었지만 동네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차피 농사지을 놈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예산농업학교 4학년 때였어요. 혼자서 무릎장단으로 시조 한 수를 읊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싹수가 있다며 선생을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때 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시조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19세 때에는 이미 청년명창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업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중 23세 되던 해에 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 당진군 정미면사무소의 서기가 되었다. 그때 늘 시조를 중얼거리고 다닌대서 ‘시조서기’란 별명까지 얻었다. 시조는 이양교씨에게는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시조밖에는 몰랐으며 시조에 얼마나 미쳤던지 버스를 타고 흥얼거리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는 기차 안에서까지 흥얼거리다 새색시한테 핀잔을 받기도 했으며, 6·25때는 의용군에 차출되었으나 시조 친구 덕분에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면서기 2년만에 휴전이 되자 공부를 더하든가 서울에서 취직할 요량으로 무작정 상경하였으나 공부나 취직은 뒷전이고 시조방부터 먼저 찾았다. “파고다공원 앞에 있는 탑동 시조방에 가서 시조 한 수를 했더니 거기 모인 어른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중에는 이범승(전 서울시장)씨도 있었는데 그 분이 종로구청에 취직까지 시켜주었어요.” 시조 공부하러 갔다가 취직까지 된 그는 3년만인 57년에는 시조 때문에 직장을 내놓아야 했다. 종로구청의 이웃에 있는 시조방에 점심시간에 들렀다가는 직장에 늦게 돌아오기가 일쑤였던 그를 근무태만이라 하여 해직했던 것이다. 시조를 선비의 여기(餘技)로 여기던 그를 전문가객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1959년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의 금상 수상이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이주환(당시 국립국악원장) 선생이 ‘목소리는 좋으나 깊이가 없어. 진짜 소리를 하려거든 격조높은 가사와 가곡을 배우라’면서 자신이 지은 가곡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사부로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가사와 가곡을 배웠지요.” 그래서 이씨는 이때부터 ‘정악(正樂)연구소’와 ‘국악원’을 오가며 이주환선생으로부터 가곡과 가사수업을 착실히 받았다. 사부의 이씨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였다. 그를 위해 특별반을 만들고 끼니때면 청진동까지 가서 설렁탕을 사주며 일취월장하여 어서 대성하라며 격려하였다. 가사와 가곡을 배우는 10년 동안, 5·16 이후 직장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생계를 꾸리는 일이 큰 부담이었다. 탑동 시조방에서 시조를 가르치는 한편 고급요정에 가서 기생들을 집단지도하기도 하였으며 명사들의 시조 개인지도도 하였다. “명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유진산(柳珍山)씨입니다. 5·16후 연금상태에 있을 때 1주일에 사흘씩을 지도하였는데 그분의 국악사랑정신은 대단했어요. 그분이 집권했더라면 국악에 대한 위상이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 ‘국립국악원’ 시조 강사가 되고, 1974년 ‘국립국악원 정식연주단’ 단원이 되고, 1975년에는 가사의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그는 비록 가사의 예능보유자로만 지정되어 있지만 가곡과 시조에도 능통하여 가히 우리나라 정가(正歌)의 달인(達人)임에 틀림없다. 이씨는 그후 후진양성과 정가의 악보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2가사전(악보)을 펴냈으며 추계예술대, 중앙공무원교육원, 내무부지방공무원연수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숙명여대평생교육원에서 가사와 시조의 전수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사분야에 대가를 이룬 이씨는 제자복이 많은 것을 또한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 보유자후보 황규남(黃圭男)을 비롯하여 ‘국악원’ 연주단원 이준아(李埈娥),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원’ 김병오(金炳吾), ‘국악원’ 학예연구사 문현(文鉉),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김용우(金龍雨)가 이수를 마쳤으며 고유경, 권성택, 이병옥, 윤문숙 등이 그의 법통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올해가 서울 정도(定都)6백년이며 가사(歌詞)3백년이고 국악의 해임을 기념하여 지난 3월에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서울가악회(歌樂會)’를 결성하고 지난 6월에 가사발표회(歌詞發表會)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으로 활약중인 그는 몇 년 전에 탈고한 <시조창보>와 <가곡선집>(악보)을 내고 시조창을 음반으로 취입하는 것이 올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정부당국과 재계에 대하여 국악의 해에 걸맞는 국악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망하였다. “서당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은 <문기악이지기정(聞其樂而知其政)(그 나라의 노래를 들으면 그 정치를 알 수 있다)>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 이미지
- 연계정보
- 관련가치정보
- 연계정보
- -가사
- 관련멀티미디어(전체5건)
-
이미지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