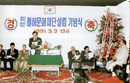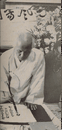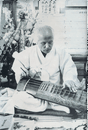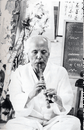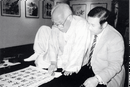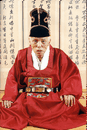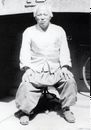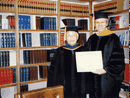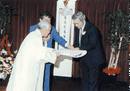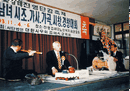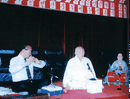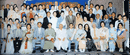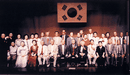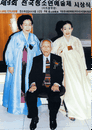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정경태 (호: 석암, 1917.2.8~)
- 예술가
- 정경태 (호: 석암, 1917.2.8~)
- 구분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관련정보
- 1975.7.12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 학력(계보)
- 나이봉에게 한문과 서예 수학 정도경에게 사서삼경 및 시문 공부 1930. 주산보통학교 졸업 1930.12.30 한문수학 1931. 오성현, 김춘경, 이도삼에게 사사 1934. 명가 임재희에게 주박(主薄) 가사 사사 1936. 죽민 전규문에게 가곡여창 사사 1936. 두봉 이병성에게 가곡남창과 12가사 사사 1942. 현금, 단소, 대금 등 연주법 수학 1950. 호석 임석윤에게 현금회상 사사 1950. 금사 김용근에게 현금가곡 사사 1990. 미국 켄싱턴대 명예문학박사 학위 취득 1992. 일본 동경신학대학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
- 생애(약력)
- 1947.4. 부안농업고등학교 교사 재직 1953.~1958. 전주고등학교 교사 1953.10. 전주국악원 창설 1963.10. 대한시우회 창립 회장 취임 1980.8. 대한정악회 창립 회장 취임 1981.2. 문화재전수소 겸 대한시우회관 건립 1985.~1993. 전주우석대학교 국악과 강사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강사 1997.10. 대한민국 보관 문화훈장 수여 1999.8. 공개행사 발표공연(서울 중구청구민회관) 2000.8. 공개행사 발표공연(서울 중구청시민회관) 2000.12. KBS 국악대상 공로상 수상 2001.8. 공개행사 발표공연(서울 종로구구민회관) 2001.10. 방일영국악상(방일영문화재단) 수상 2002.8. 공개행사 발표공연(서울 종로구구민회관) 2003.8. 공개행사 발표공연(서울 중구청구민회관 소강당)
- 리뷰
- 정가∙시문∙서화 모두에 능한 삼절 ‘대한시우회’ 결성, 매년 경창대회도 인간별리(人間離別) 만사중(萬事中)에 독수공방(獨守空房)이 더욱 섧다 사상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을 게 뉘라서 알리 맺힌 시름 이렁저렁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후리쳐 던져 두고 자나깨나 깨나자나 임을 못보니 가슴이 답답… 이상은 가사(歌詞)의 예능보유자 정경태(鄭坰兌)옹이 즐겨 부르는 <상사별곡(相思別曲)>의 첫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사(歌詞)란 가곡이나 가요곡 등 갖가지 노래의 내용이 되는 사설이란 뜻의 가사가 아니라, 가곡(歌曲)∙시조(時調)와 함께 우리나라 정가(正歌-歌樂)의 한 갈래를 이루는 성악곡으로,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는 가사를 말한다. 가사(歌詞)는 가사체(歌辭體)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에 담은 노래로 백구사(白鷗詞)라고도 한다. 가사는 고려말기와 조선조 초기부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당시의 것은 임진왜란 후에 없어지고 현행 가사는 <청구영언(靑丘永言)> 시절인 영조 때에 그 틀이 잡혔으며 12가사가 성립된 것은 조선조의 말엽으로, 그 당시의 가단(歌檀)에 군림하였던 박효관(朴孝寬)이 하준권(河俊權)과 안민영(安旼英)에게 전수하고, 금하(琴下) 하규일(河圭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 맥을 이어왔다. 진안군수(鎭安郡守)로 있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관직을 버린 하규일(河圭一)(1867~1937)이 그 뒤 ‘이왕직 아악부’ 사범으로 임명되어 성경린(成慶麟), 이병성(李炳星), 이주환(李珠煥), 장사훈(張師勛) 등에게 가사의 맥을 이었으며 이병성(李炳星)은 정경태(鄭坰兌)에게, 이주환(李珠煥)은 이양교(李良敎)에게 그 예능을 전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자양2동 608의 23. 가사의 예능보유자 석암(石菴) 정경태(鄭坰兌)옹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14세 때에 장가들어 재행(在行)을 가서 시회(詩會)에 나가 장원을 하자 동서 되는 감한술이 ‘문장에서는 석암(石菴)에게 졌지만 시조는 내가 잘할걸’ 하며 시조창을 불러 좌중을 사로잡더라고요. 그에 자극 받아 동네에 돌아가 즉시 시조를 배우게 되었고 이게 인연이 되어 가사와 가곡까지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석암(石菴)은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에서 1916년, 3백석을 거두어들이는 지주(地主) 정종운(鄭鐘韻)의 3남1녀 중 맏이로 태어나 사랑방에 출입하는 문장가와 율객들의 풍류를 익히며 자랐다. 7세 때부터는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1세에는 나이봉으로부터 서예를 배웠고 13세에는 유학자 정도경으로부터 시문을 사사하여14세 때에는 이미 칠서(七書-사서삼경)를 모두 마쳤다. 그때 이미 그는 한시(漢詩) 250수와 50 여 편의 작문을 지어 지니고 있었다. 8세에 주산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1세에 부친상을 당하자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작파하고 말았으며 14세에 혼인하고부터는 사랑방의 풍류객들을 직접 접대하며 교류를 넓혀 갔다. 재행(在行)에서 돌아온 그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 길로 한마을의 오성현(吳聖鉉)으로부터 시조를 배우기 시작하고 고흥의 김춘경(金春景)을 모셔다 더 배웠으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도삼(李道三), 오윤명(吳允明)으로부터는 <상사별곡>, <처사가> 등의 가사와 가곡을 배우고 하규일의 8가사와 가곡 남녀창 음반을 구입하여 혼자서 익혔다. 18세 되던 해에는 장성 백양사에서 지방의 명가(名歌) 임재희(林在熙)로부터 가사를 사사하고 그 2년 후에는 정읍에 살던 대금의 명수 죽민 전계문(竹民 全桂文)으로부터 가곡 여창(女唱)을 사사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23세 되던 1939년에는 방송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 마침내 당대의 선가(善歌) 두봉 이병성 (斗峰 李炳星)을 찾아가 그의 문하에 들었다. 이때 석암은 두봉으로부터 너무 진도가 빠르다는 질책을 받을 정도로 두봉의 예능을 빠르게 전수 받았다. 곧 시와 율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는 박헌봉과 어울렸고, 시조 3장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두봉 선생에게 12가사와 가곡을 모두 익히고 부안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2년 후에 그 시골로 내려 오셨더라고요. 72일 동안을 유하시면서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해’ 하시더라고요. 그 후 3년 동안을 더욱 정진하였습니다.” 또한 석암은 어린 시절부터 서화를 익힌데다 의제(毅齊) 허백련과 이당(以堂) 김은호로부터 필법과 사군자를 배워 이 방면에도 출중한 솜씨를 가졌으며 장기와 바둑에도 뛰어나며 (동아일보의 기보(碁譜) 해설가 우석 정동식(宇石 鄭東植)은 그의 장남이다) 술서(術書)를 탐독, 음양학에도 재주를 보여 가는 곳마다 인기를 독차지 하였다. 한편 가사∙가곡∙시조 등 모든 정가에 일가를 이룬 석암은 1944년부터는 배우는 단계에서 가르치는 단계로 넘어와 있었다. 이때 송창섭, 김소란, 박향란, 김옥희에게는 가곡 여창을, 유종구, 고민순에게는 남창을 전수시켰다. 이리향제줄풍류의 예능보유자 강낙승(姜洛昇)도 이 무렵부터 그에게 12가사와 가곡 남창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듬해에는 그 동안 꾸준히 채보해온 가락을 정리하여 <조선창악보>를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는 전라북도 학무과에 초빙되어 도내 초중학교를 돌며 한글에 대하여 순회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안농고의 국어교사로 발탁되고 이듬해인 1948년에는 전주명륜대학의 전임강사로 초빙되었으며 6∙25 후인 1951년에는 김제고교로 옮겼다가 1953년에 전주고교 교사로 전임하였다. 전주고교 교사시절에는 특별활동반으로 국악반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시조를 보급하고, ‘전주국악권’ 창립의 산파역을 맡는 한편, 단소∙대금∙북가락∙범패 등의 채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스스로 춤∙거문고∙단소 등도 계속 배웠다. 그리고 55년에는 10여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채보하고 정리하여 온 <국악보(國樂譜)>를 간행해 냈다. 이 악보는 18종의 악기연주법을 비롯하여 가사∙가곡∙시조는 물론 판소리∙민요∙단가∙가야금병창 등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주요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어 선구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고교를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친 석암은 풍류객으로 시조와 가사를 부르며 전국을 순유하여 ‘정삿갓’이란 별명을 얻었다. 한번 집을 나가면 몇 달씩이나 집에 소식을 전하지 않기를 예사로 하였다. 오죽하면 집에서 ‘모친위독’이라는 신문광고를 냈으랴. 석암은 이 때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른 시조의 가락을 통일하였다. 경제(京制)∙내포제(內浦制)∙완제(完制)∙영제(嶺制)∙반영제(半嶺制)∙원제(元制) 등으로 각기 다른 가락을, 가사와 가곡을 배운 것을 밑거름으로, 반영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니 전국의 시조인들이 이를 석암제라 부르고 있다. 김천에서 대전으로 거처를 옮긴 석암은 1963년 시조인들의 모임인 ‘대한시우회(大韓詩友會)’를 창설, 이사장을 맡아 전국에 지부와 지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시조∙가사∙가곡을 보급, 국민개창운동을 벌이는 한편 매년 전국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를 열고 있다. 1975년 7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자 그 해 11월에는 국립극장에서 가사∙가곡발표회를 가졌으며 이후 가사와 시조의 후학지도와 보급운동에 전념해 왔으며 1979년에는 국악계 원로들로 ‘대한정악회’를 창설, 회장직을 맡아 국악의 올바른 뿌리와 줄기를 찾아 그것을 계승 보급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석암의 가사를 이을 후계자는 많다. 보유자 후보 김호성(金虎成)과 조교 백분악(白粉岳)을 비롯하여 강낙승, 이상술, 차명환, 임산봉, 고민순, 임종숙, 이강근, 김해숙 등 단단한 재목들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에는 이들 제자들과 함께 가사와 가곡 전창(全唱)발표회도 가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 동안은 노구를 이끌고 전주(全州) 우석대학에 1주일에 2회식이나 원정강의를 다니는 열의를 보였으며 희수(喜壽)를 넘긴 지금도 한양대와 이대 국악과를 나온 김선주와 정희자 두 전수생을 지도하고 있다. 석암은 이밖에도 한시(漢詩)와 서화(書畵)에도 남다른 정열을 쏟았다. 많은 한시를 지어 4권의 <석암시문집(石菴詩文集)>을 펴냈으며, 포항에서 ‘제1회 시서화예전(詩書畵藝展)’을 연 것을 비롯, 해남∙영주∙대전∙구례∙여수∙부산∙서울 등지에서 10여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미국에서만도 L.A∙뉴욕∙시카고∙필라델피아 등지에서 네 차례의 전시회를 가졌다. 그의 저작활동도 특기할 만 하다. <가사보(歌詞譜)>를 비롯하여 <시조보(時調譜)>, <가곡보(歌曲譜)>, <조선창악보(朝鮮唱樂譜)>, <아악보(雅樂譜)>, <국악보(國樂譜)>, <가악보(歌樂譜)>, <증보주해시조보(增補註解時調譜)>, <시호록(詩號錄)>, <김립시집직역본(金笠詩集直譯本)>, <고금천문학(古今天文學)>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최근에는 <석암시문집(石菴詩文集)>의 넷째권과 <명심보감직역본(明心寶鑑直譯本)>을 펴냈으며 지금은 조선 성종 때에 저술했던 <악학궤범(樂學軌範)>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연년익수(延年益壽)하여 타고난 재주를 여러 방면으로 분산하지 말고 오직 가사에만 전심전력하여 큰 족적을 남겨 주기를 바랄 뿐이다. <월간 문화재>, 1994년 11월, 제124호 국악(國樂) 바른 계승에 주력 석암 정경태(石菴 鄭坰兌)옹 1946년 <조선창악보> 발간 가사창(歌詞昌) 기능보유자 “시조가사는 영조때부터, 가곡은 고구려때부터 있었지만 구전(口傳) 됐을 뿐 기록되지는 않았지요. 일반인이 악보를 통해 시조창(時調唱)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사창(歌詞昌)기능보유자 석암 정경태(石菴 鄭坰兌)옹(71·중요 무형문화재 41호). 정옹은 다음과 같이 가사창(歌詞昌)을 설명해 준다. “장편 가요중에서 품격이 높은 한정된 작품을 일컫는 것이지요. 상사별곡, 춘면곡, 백구사, 황계사, 길군악, 어부사, 죽지가, 권주가, 치사가, 양양가, 매화가, 수양산가 등 12곡인데 이를 12가사라고 합니다. 향토색이 짙고 유창할 뿐 아니라 완만한 박절에 섬세하면서도 곡절이 굵어 여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민속음악에 얹어 부르는 가곡이나 시조창과 구별 되기도 합니다”고. 지난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인 가사창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정옹은 국립극장서 가사, 가곡 발표회도 가진 바 있다. 정옹은 한시(漢詩)와 서예, 거문고, 장기, 바둑 등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다. 1916년 2월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한 정옹은 어린 시절 보통학교를 다닐 때부터 마을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익혔다. 15세때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마치고 한시(漢詩) 2백 80수를 지었다고 한다. 국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처가에 있을 당시 그 고장 3개 서숙의 합동 시회에서 정옹이 장원을 하자 동서인 김한술씨가 “문장에서는 석암에게 졌지만 시조는 내가 잘할걸 하며 시조창(時調唱)을 불러 좌중을 사로잡은 일에 자극받아 시조창을 배우게 됐다”고. 16세때부터 오성현(吳聖鉉), 김춘경(金春景), 이도삼(李道三) 등에게 시조창을 사사받았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고는 결코 손을 놓는 일이 없는 정옹은 시조창에 만족하지 않고 오윤명, 임재희, 이병성 문하에 들어가서는 가사와 가곡을 익혔다. 정옹은 오랫동안 꾸준히 채보해 온 음가를 정리 탈고하여 1946년 <조선창악보>를 간행하기도 했다. 정옹은 해방 이듬해 뜻하지 않는 교직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전북 부안농고 국어교사에 이어 전주 명륜대 전임강사, 김제고교 교사, 전주고교 교사 등 17년 동안 교직생활에 투신하기도 했다. 정옹은 국어교사에 발탁된 것은 독학으로 문세영씨가 지은 <조선어사전>을 암기했으며 조선어 문법을 연구해 온 것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주고교에 부임당시 전주국악원 창립 산파역을 맏는 한편 단소, 대금, 북가락, 범패 등의 채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석암은 1955년 1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 채보하고 정리하여 온 국악보(國樂譜)를 간행, 18가지 악기의 율음을 부호화하여 율여명으로 그 곡조를 만들기도 했다. 석암은 평생을 통해 해온 일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시조 각제의 정리’라고. “시조 경창 때마다 곡조의 통일이 없어서 평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정옹은 가곡과 가사를 공부한 것을 밑거름으로 시조의 기둥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여러 평시조 가운데서 반영제를 바탕으로 평시조를 가다듬었다고 한다. 초장을 6박으로 길게 하고 중장은 4박으로 짧게 하는 것을 옛날제(制) 대로 초장을 4박에 끝내고 중장은 6박에 끝나도록 복원하기도 했다. 12가사 역시 통일이 안된 것이 안타깝다는 그는 곡조나 창법을 부르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약간씩 틀릴 수 있겠으나 가사 전체가 통일돼 있지 않으니 문제라고. 정옹은 “외형만 비대할 뿐 그 내용은 빈약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국악의 올바른 뿌리와 줄기를 찾아 그것을 계승, 보급시키는데 있는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대한정학회(正學會)’ 회장, ‘대한시우회(詩友會)’ 회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옹은 “정악(正樂)을 하면 선비의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어 좋다”고. 시우회 회원은 1백 30여명이나 되고 “민간풍류가 쇠퇴하는 게 안타까워 조직했다”는 정악회회원도 1백여명이 넘는다. 고희를 넘긴 석암은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9차례의 서화전을 열었고, <시조보(時調譜)>와 <아악보(雅樂譜)>, <국악보(國樂譜)> 개인시집 <석암시문집(石菴詩文集)> 등을 출판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관광시조(1백 20수) 주해본을 탈고해 놓았으며 곧 <악학궤범(樂學軌範)>지역본도 출간할 계획이다. 정옹은 ‘정삿갓’이란 색다른 별명을 갖고 있는 것. 기약 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평생을 살아오기 때문. 정(鄭)옹은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으나 모두 출가 제 구실을 잘 하고 있어 한시름 놓는 표정. 현재 운수승 같은 정옹에 있어 닻의 구실을 하고 있는 석정숙 여사와 생활하며 가사 전수 훈련에도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국악신문>, 김창모 기자, 1986년 1월 22일
- 이미지
- 연계정보
- 관련가치정보
- 연계정보
- -가사
- 관련멀티미디어(전체30건)
-
이미지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