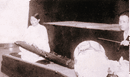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가야금산조(부산)
- 작품/자료명
- 가야금산조(부산)
- 전승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지정여부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 구분
- 민속악
- 개요
-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을 <가야금 산조>라고 한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굿거리, 늦은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세산조시) 등의 장단 중 산조에 따라 3~6개의 장단 구성에 의한 악장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장구 반주가 따른다. 각 장단의 느낌을 살펴보면 ‘진양조’는 아주 느려서 서정적이고, ‘중모리’는 안정적이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운다. ‘자진모리’는 밝고 경쾌하고, ‘휘모리’는 흥분과 급박감이 있다.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산조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기교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서 여러 유파가 형성되었다. <가야금 산조>는 19세기말 고종 때 김창조(金昌祖)가 틀을 짜서 오늘날과 같은 산조의 체계를 세웠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김창조 이후 많은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 탄생하였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가락을 첨가하기도 하고, 약간 바꾸기도 하여 보유자의 이름을 붙여 ㅇㅇㅇ제(制), ㅇㅇㅇ류(流)로 전하고 있다.
- 내용
- <강태홍류(姜太弘流) 가야금산조>는 막아내기, 눌러내기 등 어려운 기교가 많아 기교파의 총수로 평가된다. 특징을 보면 산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계면조’(슬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음조)를 줄이고, ‘우조’(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조)와 ‘강산제’(목소리가 분명하고 정교하여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음조)를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호쾌하고 온화한 면이 많다. 가락은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엇박이 많이 나타난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전통 음악 중에서 순수한 음악미를 추구하는 독주곡으로, 다른 산조에 비해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다. 강태홍이 김창조로부터 사사받아 자신의 가락을 첨가하여 이루었다.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었던 것이 1950년 이후 세산조시(일명 단모리)가 첨가되었다. 장단별 조의 구성을 보면 진양조는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 중모리는 경드름, 평조, 계면조, 강산제, 중중모리는 강산제, 평조, 자진모리는 강산제, 우조, 계면조, 휘모리는 계면조, 강산제, 세산조시는 계면조로 이루어졌다.
- 전승자 정보
- 효산 강태홍 선생은 전남 무안 태생이다. 부산은 선생에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부산에서 자신의 새 산조를 완성시켰으며, 원옥화, 강남월, 박차경, 김춘지, 구연우, 신명숙 등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그가 부산의 동래권번 시절 처음 가르친 제자는 원옥화였다. 그러나 재주가 있었던 원옥화는 불운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김춘지에 이르러 강태홍류 산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고, 막 꽃을 피우려는 때에 그만 김춘지 마져도 병으로 작고하였다. 그 후 강태홍류 산조의 법통은 구연우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선생의 표현대로 '번듯한 제자'로서 일찍이 16세 무렵에 제발로 찾아오 남제자였다. 그는 선생의 완성된 산조를 처음으로 배운 뒤 비로소 스승의 가락을 세상에 펼치기 시작하였으나, 그 마저도 오래가지 않아 그만 지병으로 스승과 선배들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 그러나 한가닥 예연(藝緣) 남아, 선생의 마지막 제자이자 구연우의 부인인 신명숙이 장롱 깊이 묻어두었던 가야금을 세상에 들어내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 만에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의 마지막 제자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되었다. 1989년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가 부산무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을 받으면서 보존회가 발촉되었다. 1993년에는 강태홍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기념제는 연주회의 학술발표회를 함께 포함하여 한층 의미를 더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효산국악제가 태동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올해 4회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자료제공 강태홍류가야금산조 보존회>
- 연계정보
- · 관련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관련사이트
- 용어해설
- 세산조시(단모리) : 국악에서 판소리나 산조 등에 쓰이는 장단의 하나이다. ‘휘모리’ 또는 ‘세산조시’라고도 한다. 자진모리 장단이 더욱 빨라져서 2분박으로 변한 것이다. 경드름 : ‘경토리·경기민요조’라고도 하며,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경드름’이라고도 한다. 민요와 무가(巫歌)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선법으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서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솔·라·도·레·미로 구성되며, 마침음은 ‘솔’이나 ‘도’이다. 세마치장단·굿거리장단이 주로 쓰인다.
- 관련사이트
- 문화재청
- 관련멀티미디어(전체6건)
-
이미지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