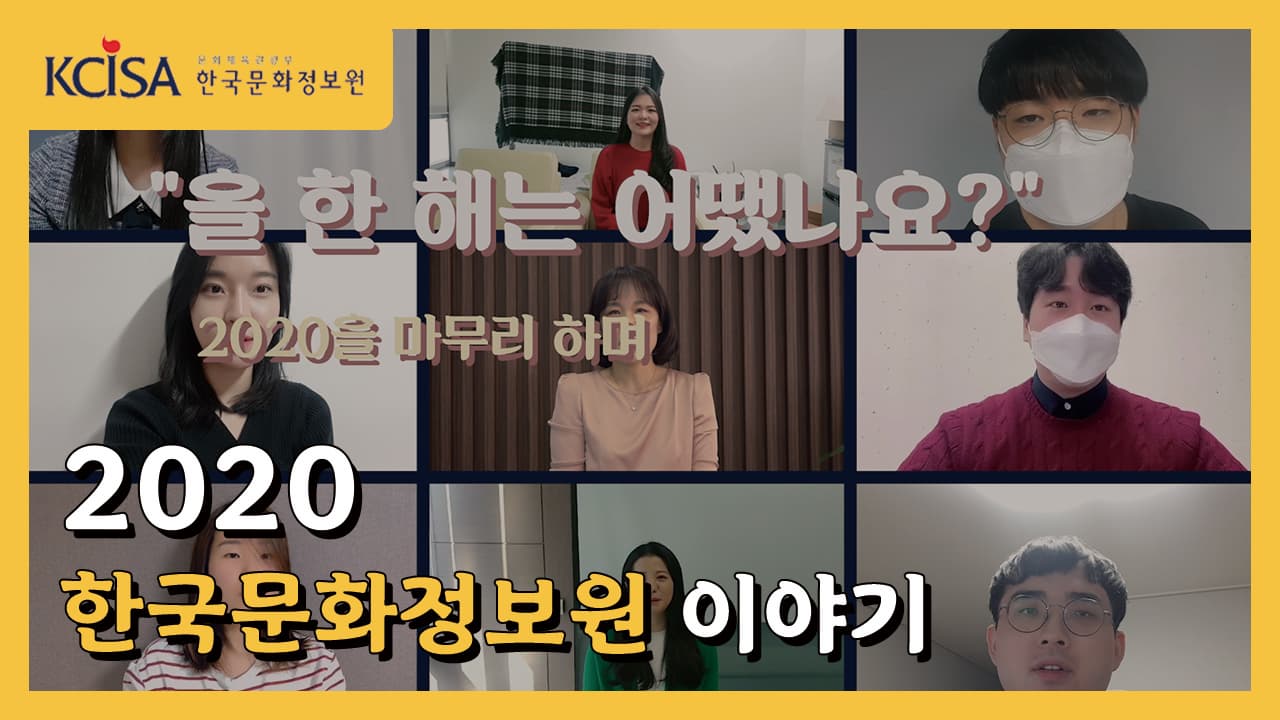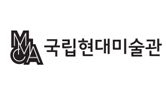문화영상문화포털의 크리에이터 문화PD의 영상을 소개합니다
#기획의도:
우리는 IPTV, 음원 스트리밍, 디지털 카메라 등 월정액으로 영화·음악, 사진 콘텐츠를 ‘소비’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소비’를 할 뿐,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여기, 매순간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것들을 손으로 만지고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습판사진을 찍는 ‘등대사진관’이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독립서점, 도시재생공간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레트로 감성‘이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옛 것’을 놓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등대사진관’의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흑백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물질매체가 주는 감성과 ‘물질성’, 그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타이틀: Print is Not Dead
#자막, 나레이션:
수정을 하면 현실이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날로그 사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는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습판 사진을 하게 된 거예요.
1850~90년 정도 전 세계로 성행했던 사진 초창기에 대중화된 사진술이고요.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 장르가 워낙 생소한 장르이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가까이 시간을 들였어요.
습판 사진은 입자나 그런 것들이 은입자로 이루어져서 불규칙적이에요. 디지털 사진보다 선명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진에 왜 매력을 느꼈냐면 저희가 준비해서 정확하게 찍으려고 해도 불규칙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얼룩들도 있고 찍을
때마다 매번 다르고.
남자 두 분이 제주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룩이 너무 심한 거야, 진짜 반이 얼룩이에요. 그래서
다시 찍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나 그럴 거면 여기 안 왔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다’.
습판사진의 프로세스 상 한 컷 찍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손님이 오시면 포즈를 연출하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때문에 그게 한 5분~10분 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필름을 자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만들고 나와서 촬영을 하고 들어가서 현상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정착하는 과정(까지)
아날로그 문화들은 약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과정도 번거롭고, 그런데, 사진이 나오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한 장밖에 없다는 그 의미도 좋아하시고.
독립서점이나 LP판 수동카메라. 하나의 문화적 흐름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생활에 편의를 느끼면서 생활하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지 않은가. 너무 빠르기에, 빠르고 편하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음악을 들으려면 LP를 사거나 테이프를 사서 들었고 20-30년이 됐는데도 서랍에 20년 전에
들었던 테이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존재하는 거죠. 디지털 파일로 되어있는 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어디 있는 것 같지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화 되어 있는 문화들이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죠. 시간을 담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닐까.
사진의 의미는 기록이다. 기억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남잖아요. 기억을 소환해주는 기록. 아날로그 문화나
손으로 하는 기술들이 사라지기에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기에 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한국문화돋보기-국악편] Ep.3 Moderntimes, listen to modern Korean classical music!](https://www.culture.go.kr//upload/contents/2022/01/2201210918.jpg)

![[랭킹즐길거리] 가을에 가기 좋은 이색 도서관](https://www.culture.go.kr//upload/contents/[C2DCBC94AE30D68DC601C0C1] B7ADD0B9C990AE38AC70B9AC_AC00C744C5D0AC00AE30C88BC740B3C4C11CAD00_171101.mp4_20171101_153921.129171101155921550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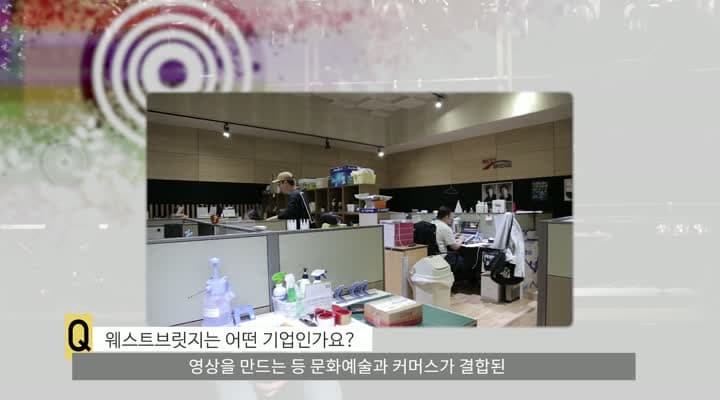

![[문화직업30] 방송연출가 편](https://www.culture.go.kr//upload/contents/BC29C1A1C5F0CD9CAC001608011358329162.jpg)



![[문화TV] 글로리펍앤카페 '음미하다' - 어쿠스틱 공연 (밴드 Gift)](https://www.culture.go.kr//upload/contents/7_AE00B85CB9ACD38DC564CE74D398 C74CBBF8D558B2E4 ACF5C5F0 BC34B4DCAE30D504D2B816080213143843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