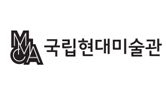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인동일기 1
- 작품명
- 인동일기 1
- 저자
- 김창완(金昌完)
- 구분
- 1970년대
- 저자
- 김창완(金昌完, 1942~) 시인. 전남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출생. 호는 금오(金烏). 1963년 조선대학 국문과 졸업. 1973년 시 <개화>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풀과 별>에 시 <꽃게>, <가을을 보내며>가 추천되었다. 현실과 인간존재의 발현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73그룹>의 회원이며, 대표작으로는 <화백 회의록>, <겨울바다>가 있다. <반시>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시집으로 <인동일기>(1978), <우리 오늘 살았다 말하자>(1983)를 간행하였다.
- 리뷰
- (……) 1973년 김창완은 서울에 발을 내린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부랑민들이 그렇듯이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떠돌며 기아와 혹한이 가져다 주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 여기에 이르러 그는 그 자신이 별수없이 바다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아니라 막벌잇군이며 새마을 취로 사업장의 날품팔이며 기러기 소리에도 눈물짓는 회향병자(懷鄕病者)의 대열에 끼어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대열에의 편입은 그에게 여러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개화>에서 보여 주었던 ‘명징한 에스프리’가 빛을 잃고 시들어 간다는 점이다. <인동일기>나 <돌멩이>에서 살필 수 있듯 그는 이제 ‘저것’으로서의 바다가 거느린 상상력을 버리고 “무엇보다 먼저 움켜쥐게” 될 돌멩이를 생각한다. 바다 대신에 돌멩이가 그의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다. 이 돌멩이의 비상을 위해 그는 완강하고 의젓한 남성적인 힘을 원한다. 이 시기에 보인 그의 표준말에 대한 집착은, 서울살이에서 갖는 도시인에 대한 콤플렉스와 그 의젓한 남성적인 원망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되는데, 김 형의 시에 대한 나의 흥미가 가장 쏠리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 표준말의 집착이다. 이것은 그의 약점이자 또한 그의 시의 현실성이다. (……) 김창완의 시는 돌멩이의 비상과 같은 저항 정신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어두운 힘을 담는 서민어를 버리고 표준어를 취하는 상호 배반적이며 모순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김창완의 모든 시어가 양성어 지향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시에는 양성어와 마찰하는 상당량의 음성어와 상당량의 냄새나는 상민어(常民語)들이 산재해 있다. (……) 최근 들어 김창완은 바다의 부름에 더욱 끌리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은 돌의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뜻함을 물론 그의 그리움이 이제는 ‘바다’에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경험의 바다나 저것으로서의 바다는 현실과 이념의 구조적인 이해 위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단순한 감각적인 바다였다. 그에 비해 이 시인이 새로이 귀기울이는 바다는 그의 도시 경험이 투영된 저항적인 바다이며 억센 사나이들의 바다이다. 따라서 그의 새 바다 시(詩)들은 강인하되 무감각하지 않고 현실적이되 추하지 않다. 이 ‘바다’에서는 사투리와 음성어들이 새로운 활력으로 살아나 시에 신선한 리듬과 색채감을 부여해 준다. 그의 이 길을 나는 주의해 보고자 한다. (……) ‘사공으로서의 시인’, 최하림, <인동일기>, 창작과비평사, 1978
- 작가의 말
- 시집을 낸다는 일은, 더구나 처녀 시집을 낸다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이다. 지금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는 기분은 신춘문예 당선 통지를 받고 당선 소감을 쓰던 때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잠도 오지 않고 하늘의 별도 더 빛나 보인다. 그 동안 발표했던 작품을 시집으로 묶기 위해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짧은 기간 동안 퍽 방황했구나 하는 당황감이다. 어떤 뚜렷한 자기 생각을 확립하지 못한 채, 얄팍한 감상, 감미로운 정감, 아름다움 몇 마디의 말들에 묶여 있었고, 철저하게 고뇌하지 못하는 적당주의, 철저하게 가담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대결하지 못하는 빈약한 용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 정말 부끄럽다. 그러나, 이 시집이 나를 반성하게 해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 시집에 넣지 않은 작품이 상당수이나, 그 작품들을 없애 버릴까, 아니면 그냥 보관해 둘까 하고 망설이는 중이다. 그러면서 옛 선비들이 글을 지어 물 위에 흘려 보냈다는 데 찬탄과 존경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실은 시들은 발표한 해를 중심으로 분류했으나 꼭 그 규칙을 지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누어 묶는 것도 어떤 기준 아래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기분에 맞는 대로 모아 엮었다. ‘후기’, 김창완, <인동일기>, 창작과비평사, 1978
- 관련도서
-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5 <인동일기>, 김창완, 창작과비평사, 1978
- 관련멀티미디어(전체1건)
-
이미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