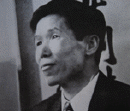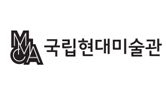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용인 지나는 길에
- 작품명
- 용인 지나는 길에
- 저자
- 민영(閔暎)
- 구분
- 1970년대
- 저자
- 민영(閔暎, 1934~)1934년 9월 6일 강원도 철원 출생. 만주 간도에 있는 명신소학교 5학년 중퇴 후 독학했다. 1957년 <현대문학>에 <동안童顔)>, 1959년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석장(石場)에서>가 추천 완료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했다. 그 뒤 <후 귀거래사>, <도정기>, <아씨>, <가신 이의 말씀>, <보릿고개>, <속요조>, <겨울밤> 등 우리 삶의 일상적 서정들을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하였다. 그의 시에는 단형시가 많은데 이는 고도의 함축과 시적 비유를 통해 시를 형상화하였기 때문이다. 소시민들의 일상, 토착적 삶의 애환과 그들의 한의 정조, 낙관적 정서를 짜여진 가락으로 노래하였다. 1983년 한국평론가협회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단장>(1972), <용인 지나는 길에>(1977), <냉이를 캐며>(1983), <엉겅퀴꽃>(1987) 등이 있다.넓은 의미에서야 동도(同道)지만, 그래도 시를 못 쓰는 내가, 시인의 시집 끝에다 발문을 쓴다니 그 가상스러운 용기에 부끄러움마저 섞인다. 그러나 이 시집의 주인이 민영인지라 부끄러움을 헹궈 우정의 찬찬한 결을 다독거려 보는 심사다. 정성껏 시를 읽는 독자들이나 혹은 시우들 간에 간혹 이런 말들을 어렴성 없이 한다. 그 사람, 시는 잘 쓰는데 사람이 덜 찼다든가, 사람은 좋은데 시는 틀렸다든가 하는 말 따위들. 이 말들을 적절한 지성의 고물을 입혀 좀더 순하게 “사람에 비해 시가 더 빛난다”, “시보다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한들, 시인이고서는 이 둘 중 어떤 말을 듣는다 쳐도 느긋할 것은 가히 없는 입장일 것이다. 그런데, 한없이 느긋하기만 한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시인 민영이다. 민영은 왜 이처럼 느긋한가. 그것은, 시와 인간이 헤벌어진 틈새 한군데 없이, 마른 벽 습한 구들 하나 없이 버물려져, 그 상충의 수차 없는 요람이 민영의 ‘삶과 시’의 본향이 되는 때문이다. (……) 민영의 시는 진실되고 정직해서 좋다. 읽어도 읽어도 감동을 주는 ‘영원한 시’는 대체 어떤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진실을 목숨처럼 정직하게 내보여주는 시이리라. 언어의 기교에만 급급한 절구결합만의 서정시나 분석의 의미만을 고려한 극단적인 긴장의 시어들로 이룩되는 시편들은 우리들의 주변에 널리고 깔렸다. 혹은 시인 개성의 구체화만 우리들의 주변에 널리고 깔렸다. 혹은 시인 개성의 구체화만을 의도한 나머지 음악조 율감에만 급급하여 감상력 이외의 능력은 없는 독자 편에 서서 자위하는 시들도 허다하다. 민영의 시가 가지는 영원성이 바로 이런 류의 문학적 비양심을 철저히 뿌리치는 데서 비롯한다면 틀린 말일까. 민영의 시를 읽으면 진실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시의 정직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런 연유는, 민영의 시들 모두가 다, 다른 시어들로는 도저히 대신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진실들로만 창조되고 있는 데 있다. 민영은 언젠가 물은 적이 있다. “시를 한갓 진실을 잃은 언어의 기교에만 내맡긴 자” “신사대(新事大)의 곡필(曲筆)을 휘둘러 순연한 민족의 고유정서를 말소하려 한 자” “시인의 영광을 소아적(小我的) 득세(得勢)와 영달(榮達)의 길로 직결시키려 하는 자”는 없는가- 하고. 민영의 시정신은 스스로의 이 물음에 이르러, 더는 논의될 게 없다. 시집 <용인 지나는 길에>는, 한국적 의식의 정수를 밀도 높은 서정의 가락에다 용해한다는, 그의 시에 대한 일반적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대답을 해주리라 믿는다. 외로울 때는 “바람에 삐걱이는/ 사립문을 닫듯” 눈을 감으면서, 목이 마를 때는 “눅눅한 바람벽에/ 허파를 대고” 돌아누우면서, “내열의 피/ 독이 되어 꺼꾸러질 땐/ 뜨겠다 죽어도 감지 못할” 새파란 눈으로 난험한 세태를 보며, 민영은 산다. 백살을 헤이며 살거라. ‘발문’, 천승세, <용인 지나는 길에>, 창작과비평사, 1977나이 사십을 바라보며 처녀시집(處女詩集)이라니, 우습다. 처녀란 이름이 붙을 바에야 이 시집은 좀더 일찍 나와서, 지금쯤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무렵의 내게는 시집을 낼 만한 여력이 없었고, 내 시집을 기꺼이 내 주겠다는 출판사도 없었다. 돌이켜 보면, 시의 일이란 이제 한탄 말업(末業)으로 타(墮)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시인이 심혈을 말려가며 시를 써도 읽어 줄 독자가 없고, 설혹 읽어주는 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효가 미미할 듯하다. (……) 물론, 이와 같은 대접의 그늘에는 시인 자신의 허물도 없지 않음을 절감한다. 시를 한갓 진실을 잃은 언어의 교기(巧技)에만 내맡긴 자, 신사대(新事大)의 곡필(曲筆)을 휘둘러 순연(純然)한 민족의 고유정서를 말소하려 한 자, 시인의 영광을 소아적(小我的) 득세(得勢)와 영달(榮達)의 길로 직결시키려 하는 자, 시인의 의무를 현실에 대한 맹종(盲從)과 선거적(選擧的) 참여로 타(墮)하게 한 자, 그러한 자가 우리들 주위에는 과연 없는 것인가? 오늘날, 참을성 있는 독자들까지 시와 시인을 외면 불신하게 한 이면에는 그와 같은 비시(非詩), 비시인(非詩人)의 과(過)도 없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탄핵(彈劾)의 화살을 상(傷)하기 쉬운 이웃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나는 내 자신에게 던진다. “과연 너는 그 모든 행위에서 제 자리를 지켰더냐?” – 백 번을 던져도 백 번 다 돌아오는 회한(悔恨)의 화살! 나의 시는 그러한 뉘우침을 밑거름삼아 발아(發芽)하였다. (……) 허나 그러한 참괴(慙愧) 속에서도 스스로 고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은, 오직 나는 그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았노라는 결백감(潔白感)이다. 비록 현란(絢爛)한 언어의 마술(魔術)로서 읽은 이의 흥(興)은 돋구지 못하였을 망정, 끝까지 나는 내 눈에 비친 바를 어설픈 재주로나마 성실히 표현하고자 애썼다. 내 시의 길이 장차 어떻게 뻗어나갈 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하지만 젊음의 한때를 두고 체득한 이 기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후기’, 민영, <단장>, 유진문화사, 1972첫 시집 <단장(斷章)>이 나왔을 때, 내 주위는 짙은 어둠과 적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하여, 내 어줍잖은 노래들을 읽어 줄 독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오직 해 저문 들판에 서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책을 서점에 내맡겼었다. 그러나 <단장>은 예상과는 달리 한 해 동안에 20만부가 팔렸으며, 그것은 내가 서점에 내 놓은 그 책의 전량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내 오관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솟았고, 그것은 아직도 나를 질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자기가 사는 시대의 온갖 상황을 똑바로 보고 목청껏 노래 부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귀담아 들어줄 사람도 있으리라는 확신이다. 제1부 ‘남조(南調)’와 제2부 ‘진혼조(鎭魂調)’에는 대략 <단장> 이후에 쓴 것들을 묶었다. 제3부와 제4부에는 <단장>에서 추려 실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산재하여 뉘우침이 앞서지만, 당장에는 역부족이라 그대로 보여 드리는 수밖에 없다. 시의 배열은 연대순을 피하고, 행의 장단과 내용의 동질에 유의하여 엮었다. 즉 시행이 짧은 것으로부터 긴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해보았다. 그리고 시미(詩尾)에 붙인 연대는, 제 1·2부에서는 최근의 것이라 발표한 해와 잡지 이름을 밝혔지만, 제 3·4부의 것에는 시작년도를 써넣는 것으로 대신했다. 돌이켜보면 <단장> 이후 5년이 지났으나, 그때 나를 두렵게 하던 어둠과 적막은 아직도 가실 줄 모르고 있다. 두려움 속에서나마 우러러볼 수 있었던 별은 자취를 감추고, 밤낮 없이 들려오던 광야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사그러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 누가 저 어둠의 벽을 깨칠 것인가. ‘후기’, 민영, <용인 지나는 길에>, 창작과비평사, 1977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용인 지나는 길에>, 민영, 창작과비평사, 1977 <단장>, 민영, 유진문화사, 1972
- 관련멀티미디어(전체3건)
-
이미지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