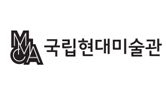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시월의 소녀
- 작품명
- 시월의 소녀
- 저자
- 전봉건(全鳳健)
- 구분
- 1960년대
- 저자
- 전봉건(全鳳健, 1928~1988) 1928년 10월 5일 평남 안주 출생. 평양 숭인중학을 졸업하였다. 1946년 월남하였다. <현시학> 주간, 자유문인협회 상임위원, 문총 중앙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문예>에 시 <원(願)>, <사월>, <축도>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사랑을 위한 되풀이>(1959), <춘향연가>(1967), <속의 바다>(1970), <피리>(1979), <꿈 속의 뼈>(1980), <북의 고향>(1982), <돌>(1984), <트럼펫 천사>(1986), <기다리기>(1987) 등이 있다. 그는 한국전쟁 체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어느 토요일>, <0157584>, <또 하나의 차폐물의 탄피>,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은하를 주제로 한 바리아시옹>, <강하(江河)> 등을 발표하였다. 연작시 <고전적인 속삭임 속의 꽃>, <속의 바다> 등은 그의 역량과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마카로니 웨스턴> 연작시를 쓰면서 물질적 풍요의 광적인 추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궁핍화된 정신적 삶을 표현하였다. 1980년대는 <돌> 연작시에 몰두하는데 ‘돌’은 자신의 삶을 쉬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자유의 장소로 그려진다. 1980년대 중반부터 다시 한국전쟁을 중심소재로 한 시를 창작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멸을 거부하는 정신으로 자신을 지키는 실존적 삶의 역사성을 기록한 <6·25> 연작시는, 절제와 균형미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분단시대의 중요한 문학적 성과로 평가된다.
- 리뷰
- 전봉건의 시는 절도가 있고 규범이 있다. 미리 자기가 지으려는 시의 틀을 정해 놓고 그 틀 속에 언어와 이미지를 배치해 가는 것이 그의 시작법이다. 그러므로 시에서 감정의 일렁임이라든가 주제의 심오함을 기대하는 독자들은 전봉건 시에서 실망을 느낀다. 처음부터 제작의 의도를 가지고 구성된 시이기 때문에 감정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 생각도 단순하다. 그러나 단순한 생각 사이에 놓인 이미지와 그 연상의 사다리는 섬세하기 때문에 시를 세밀하게 읽는 독자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초기시 중 하나인 <이 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소재로 한 듯하다. 처음 시행부터 모순된 시어가 서로 충돌한다. ‘이 희디 흰 밤/ 이 검디 검은 밤’이라니. 어떻게 밤이 희기도 하고 검기도 하단 말인가.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려 희게 빛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니까 희디 흰 밤이라고 했을 수 있고 실제로 눈이 내려 희디 흰 밤이 되었을 수도 있다. 눈이 내려 희다고 하더라도 밤이 검은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희디 흰 밤, 검디 검은 밤’이라는 시행이 의미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그 다음 연의 닫혀진 셔터, 다리, 가시덤불, 추운 말구유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 지어 우리가 처한 암담한 상황을 암시한다.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예수처럼 태어날 아이는 없다고 시인은 3연에서 말한다. 이 밤에는 희게 울리는 어둠, 검게 울리는 어둠뿐,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탄생, 혹은 어떤 구원의 기미는 없다는 것을 시행의 여백 속에 드러내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 심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심각한 포즈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정경을 스케치하듯 단조롭게 표현하였다. <사랑>이라는 작품 역시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해서 작품이 싱겁지는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담긴 내용이 아주 상식적인 것이어서 역시 시다운 압축미를 느낄 수 없다. 시의 내용인즉슨, 열매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땅을 깊이 파헤쳐 내 손의 땀을 섞은 흙을 실하게 한 후 묘목을 심고, 모진 비바람과 어둠 속에서도 묘목을 지키고, 새벽 햇살을 뚫고 과목이 솟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곧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다. 요컨대 사랑한다는 것은 묘목을 정성껏 심고 가꾸는 일이라는 뜻인데, 사랑의 마음을 묘목을 가꾸는 일에 비유한 것은 새로운 것이다. 여기서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시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마른 나뭇잎>은 그의 시가 지닌 단순한 형식미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시는 전부 4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의 첫 행이 ‘오늘은’으로 시작되어 유사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발상은 마른 나뭇잎을 통하여 신의 형상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연은 마른 나뭇잎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신의 쉰 목소리라고 했고, 2연은 마른 나뭇잎이 굴러다니는 것을 신의 발자국이 서성거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3연은 마른 나뭇잎의 모양을 수없이 금간 신의 얼굴이라고 했고, 4연은 맨손에 쌓이는 나뭇잎이 신의 눈 가장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마른 눈물이라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시는 어떤 짜임새를 갖고 있는 듯하다. 각 시연의 구성이 일정하며 의미의 전개 양상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 자신의 행동을 제시하고 다음에 마른 나뭇잎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신의 형상과 관련 짓고 다시 자신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짜임새라는 것은 형식상의 통일성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는 마른 나뭇잎이 왜 신의 발걸음이며 내 손에 쌓이는 나뭇잎이 왜 신의 눈물인지가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시인은 나뭇잎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여러 측면을 신의 형상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사물을 경건하게 대하려는 시인의 따스한 마음에 의해 대상을 변형시킨 결과이다. 전봉건은 후기로 갈수록 시행의 길이를 짧게 하여 시행 사이의 연상의 폭을 넓히는 압축적 작시법을 즐겨 구사했다. <달 뜨기 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는 거의 한 어절 단위로 시행을 구분하여 조작을 가하였다. 이렇게 시행을 잘게 나누어 놓으니 한 시행을 읽은 다음에 잠시 휴지를 두어야 하니까 여백과 연상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물기 가시었다’는 말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각각의 시행의 여운 사이에 자신의 상상의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미묘한 의미를 담은 시처럼 읽혀진다. 이러한 경향은 <작은 지붕 위에>, <북5>, <코스모스> 등의 작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80년대 이후 발표한 시에서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심화되면서 그것이 시의 주제의식으로 승화되어 형식의 단순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전봉건 시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새를 기다리며>는 바로 그런 후기시의 하나로 형식적 측면은 전의 시편들과 유사하지만 시인이 시상의 중심을 비교적 뚜렷이 내세운 점은 구별된다. 즉 이중섭의 그림, 바흐의 관현악곡, 꽃과 별이 많이 나오는 만화 등이 환기하는 화평의 정신을 그는 꿈꾸며 그런 정신의 지향을 자기에게 날아온 한 마리 파란 새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그림 이야기4> 역시 그러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그림 그리기로 환치하여 소박하게 펼쳐내었다. 저마다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어둠, 싸움, 미움, 썩음 등을 잡아먹는 색색의 물감으로 산과 들과 나무와 별을 그려 그 작은 그림을 풀칠해 이어 붙이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느냐고 시인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평화의 소망은 일면 소박한 것이기는 하지만 타락한 현세의 국면과 비교해 볼 때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정신이 시의 든든한 터전으로 자리잡기 전에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한 형식미와 평화의 정신’, 이숭원, <한국대표시인선 50>, 중앙일보사, 1995
- 작가의 말
- 1952년이면 내가 51년 이른 봄 중동부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대구 피난민 수용소 판자집에 웅크린 가족을 찾아서 돌아 온 그 이듬해가 된다. 그로부터 1980년까지 한 30년 간에 걸쳐서 쓴 작품들을 3부로 나누어 묶은 것이 이 시집이다. 1부는 50년대, 2부는 60년대, 3부는 70년대가 된다. 그러나 1980년에 출간된 비슷한 기간의 작품들을 추려서 수록한 선시집 <꿈 속의 뼈>의 것 전부와 79년에 출간된 70년대 작품수록 시집 <피리>의 것 대부분은 여기에 넣지 않았다. 또한 이번에도 역시 분량이 많은 장시 세 편 <사랑을 위한 되풀이>(57년), <속의 바다>(59년), <춘향연가>(67년)를 두 번째 선시집이 되는 여기에도 넣을 수가 없었다. 발표 연도가 분명한 작품 말미에는 그것을 밝혔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 따라서 발표 연도순으로 한다는 작품 배열은 짐작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더 밝혀 둬야 할 것은 50년대의 작품 대부분과 그 뒤의 것 수 편 등이 발표 당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거슬려 손질을 한 것이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크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이 상하고 죽는 전쟁의 마당에도 꽃은 핀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시인은 없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그 꽃색깔은 불에 탄 살색깔이나 땅을 적신 핏빛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정직한 일이고, 그렇게 말하는 시만이 진실한 시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입장과 많이 다르다. 전쟁의 마당에 피는 꽃의 색깔도 내게는 그것들이 생래로 지닌 분홍빛이거나 노랑빛이거나 흰빛이거나 그러하다. 그러기에 나는 그것들의 색깔은 그것들이 생래로 지닌 색깔 그대로이다라고 말한다. 내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함이요, 그리고 진정한 시인 것이다. 아름다움을 오직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는 눈과 말하는 입 또한 이 세상과 사람을 옳게 떠받치려는 간절한 소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겠다. 이 선시집을 엮으면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지녀 온 그러한 생각을 새삼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서’, 전봉건, <새들에게>, 고려원, 1983
- 관련도서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권영민 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현대시와 신화적 상상력>, 이명희, 새미, 2003 <현대시의 상상력과 동일성>, 박민영, 태학사, 2003 <한국 현대시의 비판적 연구>, 남기혁, 월인, 2001
- 관련멀티미디어(전체4건)
-
이미지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