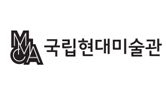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메탈릭
- 작품명
- 메탈릭
-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60-2
- 건축가
- 김인철
- 장르구분
- 1989년 이후
- 내용
- 철공업을 하는 건축주를 위한 전원주택이다. 단층의 철골 구조 건물은 자연스러운 땅의 모양 위에 그대로 얹어 놓은 듯하다. 3.6m의 그리드와 2.4m의 높이의 프레임은 각 실이 되기도 하고, 외부 공간을 끌어들이는 액자가 되기도 하나, 극적인 공간 연출이나 질서를 갖게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였다. 평면은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폭 1.2m 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들이 자연스럽게 달린 모양이다. 따라서 각 실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으며, 외부에 면하는 면이 많아서 빛과 바람이 잘 들게 되어 있다.
- 건축가
- 김인철 197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1981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2년 ‘엄덕문 건축연구소’에 입사, ‘(주)엄·이건축’ 이사를 지냈으며 1986년부터 ‘인제건축’ 대표로 활동하였다. 1996년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97년 이후 서울건축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98년부터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다.
- 리뷰
- 노출콘크리트의 표현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표정을 갖지 않는 무성이었다. 공간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형식이 앞서 나서서 저질렀던 그간의 통속성을 건너가기 위한 해법은 형식에 성격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덧붙이거나 꾸미지 않고 극히 단순한 모습이 되게 하는 의도에 콘크리트의 맨살은 유일한 방법론이었다. 1989년의 <주택-솔스티스(solstice)>로부터 1999년의 <김옥길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콘크리트 맨살만들기를 전쟁하듯 치렀다. 생각과 결과가 어느만큼 비슷하게 만나지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 또다른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숨겨 물러나 있게 할 수는 있었으나 부피와 무게의 질량감은 곧잘 생각이 궤변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내곤 하였다. 여전히 형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선적인 지각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질량을 없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또는 감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금속성에서 해결의 가능치를 탐색해보려 하였다. 비중이 압축되어진 금속은 무게와는 관계없이 선과 면의 이차원적인 감각을 만든다. 부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얇을 수 있고 무게와는 상대적이므로 가늘 수 있다. 삼차원의 공간을 구축하는 장치로 이차원적인 해결이 동원된다면 무량으로 공간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금속재의 기계적 기능성으로 표현되는 하이테크의 미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성의 근원적인 해법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보고 싶었다. 기술이 경지에 이르면 예술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관심두지 않더라도 공간실험을 위한 도구로서 금속적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작업은 석달 만에 마무리되었다. 인테리어 작업이 아닌 것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생각이 완성된 셈이다. 단층의 철골구조여서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지만 설계와 현장작업이 동시에 벌어졌으므로 마감 방법과 재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을 소모하였다.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 유리와 동판, 석고보드와 마루판, 그리고 페인트만으로 집이 되었다. 철공업을 하는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주인에게는 익히 다룰 수 있는 재료들이었고, 관련된 공사들은 그 동안 낯익혀 두었던 동료들이 도와주었다. 가볍고 얇은 선으로 느껴지는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땅에서 솟아오른 모양이 아니라 땅에 얹혀져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한 것은 그것이 땅을 점령하듯 차지하기보다 빌린 듯 놓여지기를 의도한 것이다. 산자락이 계곡으로 흘러드는 형국에서 무리한 자리잡기는 결국 또 다른 무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요한 만큼의 축대를 쌓고 땅 고르기를 한 위에 집을 놓았다. 3.6m의 그리드와 2.4m의 높이로 꾸며진 형강프레임은 현장에서 자르고 붙여서 세워진 것이다. 공장제작과 현장조립의 기계적인 공정이 아니라 블랙스미스의 손질이었던 셈이었다. 틀 위에 올려진 지붕은 떠 있듯 보이게 하고 싶었다. 최소한의 하늘 가리개를 틀 위에 들어 올려서 비스듬한 틈사이로 이웃의 숲과 산봉우리와 구름이 자리잡게 하였다. 폭 1.2m의 기다란 복도는 뒷뜰에서 앞뜰로 나가는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것에 꿰이듯 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사이는 벌여져 있다. 작위적인 질서를 갖기보다 알맞은 크기로 있을 곳에 두어져 있도록 하였다. 극적인 연출을 하거나 의도적인 손질을 하기보다 골고루 빛과 바람이 들 수 있도록 조절한 것이었다. 주어져 있는 틀 속에서의 자리잡기는 융통성의 구사만으로 충분하였다. 투명한 사이로 드나드는 빛은 밝음과 맑음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공간의 내외가 같은 밝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굳이 내외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감이 만들어질 것이며, 맑음으로 트여진 구획은 주변의 숲과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까지 하나로 어울리게 되는 또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설계소묘, 김인철)
- 영상자료
- 연계정보
- *관련도서 <건축문화>, 2000년 6월호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 한국건축가협회
- 관련멀티미디어(전체8건)
-
이미지 8건